
연출자 김숙영. 솔오페라단 “이번 무대를 통해 화려함 뒤의 외로움을 드러내고자 의도했습니다. 성 안의 쾌락과 권력 속에서도 리골레토는 철저히 고립된 인간이며,그 고독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감정이라는 것이죠.”
오페라 ‘리골레토’에서 연출을 맡은 김숙영과 무대 디자인을 맡은 김대한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강조했다.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르는 리골레토는 오페라로서는 드물게 무대 전체가 회전하며 공간이 전환되는 구조를 채택해 관심을 끈다.
김숙영은 “오페라 리골레토에 회전무대를 도입해 인간의 욕망과 운명이 반복되는 구조를 시각화했다”며 “공작은 권력의 정상,리골레토는 중심의 혼돈,질다는 외곽의 순수함을 상징하며 회전무대가 움직일수록 세 인물의 감정선은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또 “최종적으로 리프트가 모든 구조물을 끌어내리며 리골레토의 내면에 남은 공허만이 무대 위에 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대디자이너 김대한은 회전무대를 ‘권력과 쾌락 사이에서 소용돌이치는 리골레토의 인간상’이라 정의했다. 그는 “두 개의 회전판(이중 회전무대)의 간섭을 피하면서도 그 움직임이 인물의 감정선과 일치하도록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색 톤의 투박한 질감을 선택해 무대의 조형미보다 인물의 감정이 살아나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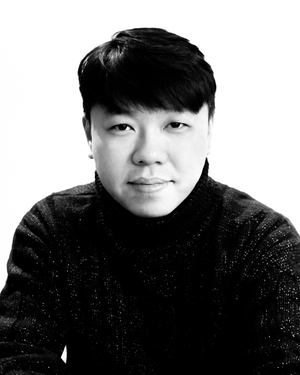
무대디자이너 김대한. 솔오페라단 김숙영이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연출노트에 따르면,회전무대는 단순한 장치가 아닌 리골레토의 심리와 권력의 순환을 상징한다. 만토바 성의 이중 구조는 벗어날 수 없는 권력의 굴레이자 딸을 향한 왜곡된 부정(父情)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김대한은 “마지막 장면에서 질다의 시신을 안은 리골레토가 무너진 성의 잔해 속에 홀로 서 있을 때 모든 장식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빈 공간과 절규뿐”이라며 “그 침묵 속에서 관객이 자기 내면을 마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출자 김숙영은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밀라노의 베르디 음악원에서 오페라 연출을 전공했다. 대표작으로 라 트라비아타,나비부인,토스카,피가로의 결혼,마술피리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영상·무대 기술을 적극 활용한 현대적 오페라 해석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대디자이너 김대한은 국립극장 무대감독으로 경력을 시작해 국내 주요 오페라·발레·뮤지컬·국악극 등에서 무대 디자인을 맡아왔다. 투란도트,카르멘,아이다,리골레토 등 대형 프로덕션에서 독창적 공간 해석을 선보인 바 있다.
